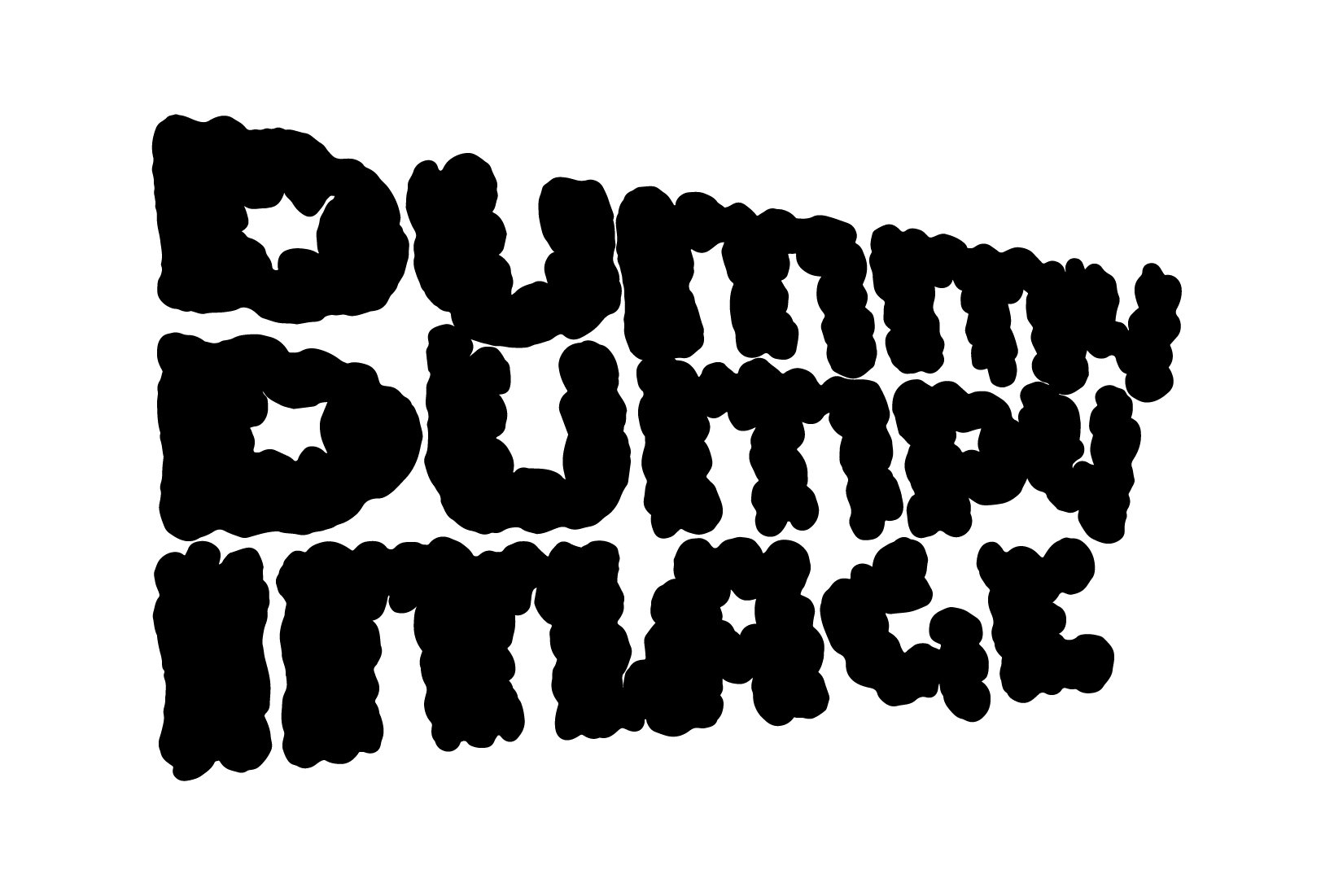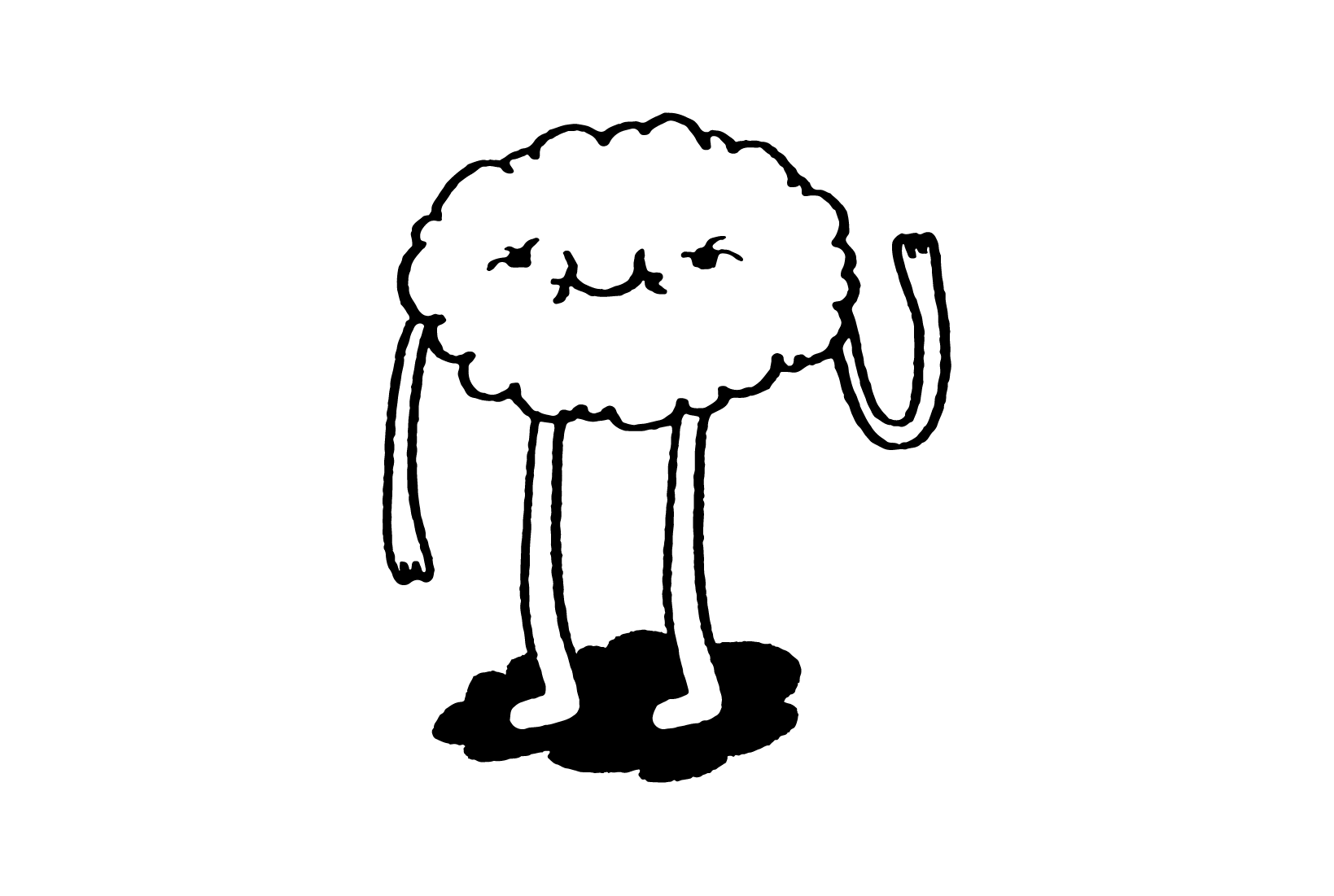바닥에 누워 음악을 들으며 피아노 연주자를 생각한다. 그때 내게 오는 것은 커지고 작아지는 소리, 높아지고 낮아지는 소리, 맺히고 퍼지는 소리,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소리이다. 장면은 그가 건반을 길게/짧게 누르는 동작으로, 가볍게/무겁게 매달리는 손가락으로, 순간의 진동으로 구성된다. Cusp의 2부를 만들며 나는 이 소리들을 자주 상상했다. 침잠한 세계가 잠시 깨어날 때의 소리. 작업은 이 한 문장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사진이 자리하는 곳마다 실재하는 소리로 연결되는 흐름이 발생했다. Hall 1에서는 박보마 작가님의 사운드 작업으로, 두산갤러리에서는 장영해 작가님의 영상 작업 속 건반음 그리고 고요손 작가님의 자장가로, 이곳에서는 Sucowania 님의 믹스셋과 함께하게 되었다. 소리와 마음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음악에서 출발할 이야기를 기다린다. - 김유자




Now playing…
김유자의 사진은 열망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상과 마주한다. 열망은 본질적으로 대상이 자신에게 없다는 전제에서 발생하며, 무언가를 열망한다는 것은 그것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간극을 내포한다. 열망하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김유자의 사진 속 보기는 대상 앞에서 스스로 항복한다. 두 개의 연작으로 구성된 Cusp 시리즈는 유통기한이 지난 필름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유실된 이미지를 마주한 순간, 작가가 느낀 놀라움으로부터 출발한다. 분명히 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는 필름의 불완전한 기능이 해체한 이미지의 표면을 응시하며, 이를 상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유실 자체를 오래 바라보고자 했다. 김유자는 이를 Cusp, 즉 ‘첨점’이라 이름 붙인다. 뾰족한 형상을 빌려온 이름 아래 사라진 것들과 그 주변의 잔여물들이 돌출되는 순간을 기다린다. 이 연작에서 그가 직면하는 것은 보는 행위의 선명함을 내려놓은 이후에 드러나는 시각의 문제이며, 그는 보기의 열망을 포기하는 방식이 역설적으로 사진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첨점이라 명명된 사진들을 두고, 김유자는 대상을 소환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진 안팎에서 계속 움직이기를 바란다. 이는 단순히 유동하는 피사체를 상상하는 것을 넘어 작가 자신 또한 특정한 위치에 머물지 않으려는 태도를 통해 가능해진다. 그는 걷는 시간 속에서 고집스럽게 보고, 걷듯이 본다. 사진을 찍으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대상을 바라보고, 스쳐 지나간다. 그의 시선이 닿는 대상 역시 가까워지고, 멀어지며,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다. 걸음으로써 의미가 생성되는 공간, 그리고 보는 것으로 의미가 새겨지는 시간. 두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진이 만들어진다. 작가와 대상 사이의 유동적인 관계는 이미지를 화면 안에 존재하게 하는 동시에 화면 밖으로 확장시킨다. Cusp의 사진들은 이를 통해 재현의 선명함을 뒤로하고 이미지 저변의 유동성에 순응한다. 정지와 움직임은 그렇게 사진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Sucowania의 음악이 사진 바깥에서 한 시간가량 흐른다. 이곳에서 음악은 청자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음악은 특정한 순간들의 연속으로 존재하며, 각 구간에서 순간적인 변주를 따라 흐를 뿐이다. 그 구성을 단번에 파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든다. “당신이 나를 낳았고 /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뒤늦은 깨달음이”1 있는 것처럼, 사고의 흐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특정한 순간에 고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들리는 것과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 사이를 오가면서, 들리는 것에 의존해 지금 순간의 음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김유자의 작업이 걷듯이 보는 태도를 통해 이미지 곁의 움직임을 포섭했다면, 음악 또한 걷는 것처럼 흘러간다. 음악도, 사진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두 작업은 서로에게 얽히기보다 함께 작동하는 방식으로 자리한다. 물론 두 작업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각각이 진행되는 방식을 잊지 않는다는 다짐만이 서로의 형성을 유효하게 만들 것이다.
음악이 끝난다고 해서 그 지속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진이 대상을 포착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멈추는 것도 아니다. 김유자의 사진 속 이미지들은 고정된 악보의 음률이 아니라, 중단 없이 이어지는 소리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음악 또한 자신의 구간을 넘어서 지속된다. 그의 사진 속에서 돌출되는 다성의 이미지들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내포한 채, 서로의 흐름 속에서 화면 밖의 음악과 맞닿아 있다.
1 이제니, 열매도 아닌 슬픔도 아닌
Editorial by 윤재희
김유자
김유자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질문한다. 그의 작업은 손상된 필름에 의해 사라진 대상, 자고 난 후 몸에 남은 흔적, 인물의 정지와 떨림 등 불명료하게 감지되는 순간들에 주목한다. 김유자의 사진은 고정된 하나의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지 속에 스며 있는 미묘한 움직임과 생동감이 드러난다. 이는 인물이 숨을 참거나 내뱉는 찰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기척, 또는 무언가 전환되는 듯한 긴장감으로 관객에게 다가오고, 이 감각은 점차 ‘보이는 것’만큼 선명해진다. 김유자는 이처럼 시각적 경험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고 확장되는 순간을 통해 사진이 다성적인 감각을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탐구는 종이의 물성과 프레임의 변주, 공간에 조응하는 설치 방식을 통해 한층 심화된다. / 《두산아트랩 전시 2025》(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2025) 전시 서문에서 발췌
yujakim.com
Sucowania
Sucowania는 2015년 독일 베를린에서 디제잉을 시작, 국외 여러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경험을 쌓으며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해왔다. 그의 음악은 거친 질감의 퇴폐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불안정함과 무질서함 속에 내재된 섬세함을 찾아내는 믹싱과 실험적인 사운드를 추구한다. 현재 서울 이태원 KOCKIRI 의 레지던트이자 스튜디오 남산에서 튜터 그리고 밴드 모임별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윤재희
영상이론을 공부하고 시각문화를 중심으로 글을 쓴다. 최근에는 이동하고 이주하는 사람들의 흐름과 그 동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